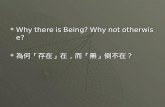11. (6) 1. 민무득이칭 民無得而稱), 임중도원...
Transcript of 11. (6) 1. 민무득이칭 民無得而稱), 임중도원...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1. 민무득이칭(民無得而稱), 임중도원(任重道遠)
민무득이칭(民無得而稱)
주 태왕의맏아들인태백은 정말지극한 덕을갖춘 사람이라할만하다. 천하를 세번이나양보하였지만백성들이그를 칭송할자취조차찾을 수 없었다.
자왈, 子曰,
태백, 기가위지덕야이의.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삼이천하양, 민무득이칭언.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
『논어(論語)』 「태백(泰伯)」
지덕(至德) 지극한덕, 최고의 덕
민무득이칭언(民無得而稱焉)
백성들이덕을 칭찬할방법이 없다.
덕을 칭찬할말을 찾을수 없다는 해석도있음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1. 민무득이칭(民無得而稱), 임중도원(任重道遠)
첫 번째사양
손자 ‘창‘을 왕으로세우려는태왕의 뜻을알고 있던 태백
오월 지방으로떠나태왕이 죽어도돌아오지않음
두 번째사양
계력이알렸음에도불구하고상을 치르기위해 달려오지않음
세 번째사양
상을 다치른 후에 머리를깎고 몸에문신을 새겨 넣어사람들이왕으로초빙하지 않게만듦
『집주』
상(商)나라와 주(周)나라의 교체시기
태백의덕이라면충분히 제후의조회를 받고천하를 소유할수 있었을것
동생 중옹과함께 초나라땅인 형만지역으로감
『집해』
태백이오월로 감
중옹도왕위를 사양하고귀국하지않음에대한 별도의언급 없음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1. 민무득이칭(民無得而稱), 임중도원(任重道遠)
권력의양보를 최고의미덕으로생각한 공자
현대 사회에서정치적권력만이아니라 경제적권력(기업)을 생각할때 항상 닥치는문제
특히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더 뛰어나다고보이는 상황에서대부분의기업들은후계 계승과정에서문제가 많이발생함
능력자우선으로계승되어야한다는 것이공자의 생각이었을것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1. 민무득이칭(民無得而稱), 임중도원(任重道遠)
임중도원(任重道遠)
증자 : 선비는뜻이 크고 강인해야한다. 책임이무겁고갈 길이 멀기때문이다. 인으로자기의임무를 삼으니책임이 무겁지않겠는가? 죽은 이후에야그만 두니갈 길이 멀지않겠는가?
증자왈,曾子曰,
사불가이불홍의,士不可以不弘毅,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
인이위기임, 불역중호?仁以爲己任, 不亦重乎?
사이후이, 불역원호? 死而後已, 不亦遠乎?
『논어(論語)』 「태백(泰伯)」
홍의(弘毅) 뜻이 크고의지가 굳센것
임중(任重) 맡은 임무가막중하다.
무겁다.
중요하다.
도원(道遠) 갈 길이멀다
기임(己任) 자신의임무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1. 민무득이칭(民無得而稱), 임중도원(任重道遠)
『집해』
포함
‘弘’은 크다는뜻
‘毅’는 굳세고결단력이 있는것
선비는 (뜻이) 크고 강인해야중책을맡고 먼 길에이를 수 있다.
『집주』
‘弘’은 너그럽고넓은 것
‘毅’는 굳세고참아내는 것
넓지 않다면그 무거움을이겨낼수 없고 강인하지않다면그 먼 곳에 이를수 없다.
정자
넓기만하고 굳세지않으면 법도가없어 서기어렵고, 굳세기만하고 넓지않으면좁아서머무를 수 없다.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2.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지∙인∙용(知∙仁∙勇)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공자가 냇가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으니.”
자재천상왈, 子在川上曰,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불사주야.不舍晝夜.
『논어(論語)』 「자한(子罕)」
서자(逝者) 가는 것, 흐르는 것
불사(不舍) 버리지 않는다.
‘舍’는 버리다는 뜻의 ‘捨’와 통함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2.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지∙인∙용(知∙仁∙勇)
『집해』
포함
‘逝’는 ‘가다’라는 말이니, 모든 가는 것이 하천의 흐름과 같다는 말
『집주』
천지의 조화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이어져서 한 순간도 멈춤이 없는 것이니이것이 바로 도의 본래 모습
그렇지만 이러한 것 중 직접 지목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물의 흐름만한 것이없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자들이 항상 성찰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말기를 바란 것
상선약수(上善若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공자의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역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 시간에 대한아쉬움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조화를 느끼는 과정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노년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과정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2.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지∙인∙용(知∙仁∙勇)
지∙인∙용(知∙仁∙勇)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왈, 子曰,
지자불혹,知者不惑,
인자불우,仁者不憂,
용자불구.勇者不懼.
『논어(論語)』 「자한(子罕)」
지자(知者) 지혜로운 사람
‘知’는 ‘智’(지혜)의 뜻
불혹(不惑)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우(不憂) 근심하지 않는다.
불구(不懼) 두려워하지 않는다.
‘懼’는 두려워하다.
용자(勇者) 용기 있는 사람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2. 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지∙인∙용(知∙仁∙勇)
『집해』
포함
不惑은 미혹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다.
『집주』
지혜의 밝음이 이치를 밝힐 수 있으므로 미혹이 있지 않으며, 이치가 사사로움을 이길수 있으므로 근심하지 않으며, 기(氣)가 도리와 의리에 짝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않는다. 이것은 배움의 순서이다.
공안국
不憂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며, 不懼는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는 것이다.
군자의 덕목
지혜(知[智])
의혹이 없음
어짊, 사랑(仁)
근심하지 않음
용기(勇)
두려워하지 않음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3. 욕기
자로증석염유공서화시좌.子路曾晳冉有公西華侍坐.
왈, 모춘자, 춘복기성, 曰, 莫春者, 春服旣成,
관자오륙인, 동자륙칠인,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욕호기, 풍호무우, 영이귀.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부자위연탄왈, 오여점야!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논어(論語)』 「선진(先進)」
모춘(莫春) 늦봄
‘莫’은 ‘暮’(저물모)의 뜻으로독음 ‘모’
춘복(春服) 봄옷
관자(冠者) 관례를치르고갓을쓴어른
동자(童子) 어린아이, 당시옆에서시중을들던아이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3. 욕기
영이귀(詠而歸) 노래를부르며귀가하다.
‘詠’은 노래 부르다.
위연(喟然) 탄식하는모양
오여점야(吾與點也)
나는증점과함께하겠다.
증점의생각에동의한다.
공자가장자의 와같은이야기를한것에 대해믿을수없음
공자가강조한것은 ‘즐긴다’의 면모를설명하고 있는것
진정한공자의꿈은무엇이었을지에대한논란
진정으로이상적인아름다운세상이만들어지고나면그다음은무엇을할것인가에대한질문도필요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3. 욕기
『집해』
포함
‘莫春’이란 늦봄삼월
봄옷이이미완성되어홑옷과겹옷을입을때에나는대여섯명의 어른, 예닐곱명의 어린아이와함께기수에서목욕하고무우에서바람쐰후선왕의도를노래부르면서선생님이계신곳으로돌아오고싶습니다.
『집주』
주생렬(周生烈)
증점만이홀로때를알고있음을훌륭하게여긴것
증점의학문
사람의욕심이끝나고나면거기에하늘의이치가곳곳에가득하여조금도빠짐이없음
정자
노인을편안하게해주고봉우를미덥게해주고, 젊은이들을감싸줌
만물로하여금타고난본성을이루지않음이없게하는것
-
11. 『논어』의 구절속으로 (6)
3. 욕기
학문을하는즐거움, 혹은학문을하는것이갖는중요한가치
그러나자연을벗삼는즐거움또한중요
현대사회의리더는하루하루경쟁속에서밀려오는일을처리하느라분주하게살아가지만그속에서창의적인사고를행하기쉽지않음
무엇인가현실에만매몰되어있으면오히려자신이 어디에있는지조차모르는경우가많음
자연속에서자신을돌아보는삶을살자
학습자료_논어와_현대_사회_11-1.pdf학습자료_논어와_현대_사회_11-2.pdf학습자료_논어와_현대_사회_11-3.pdf


![TOTOLINK (A2004NS) 無線路由器使用說明 - hkbn.net · totolink (a2004ns)路由器支持2.4ghz 及5ghz 兩種速率的無線網絡,先為2.4ghz 速 率的無線網絡,於[SSID]輸入自訂無線網絡名稱,按一下[Check](https://static.fdocuments.net/doc/165x107/5e05dd8b2e4ba50334083bc3/totolink-a2004ns-ccecce-hkbnnet-totolink-a2004nsecoe24ghz.jpg)